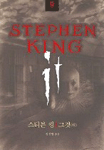 |
그것 -하 -  스티븐 킹 지음, 정진영 옮김/황금가지 |
010.
1,800쪽의 기나긴 장편인 <그것>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한 권에 사흘씩 총 아흐레 동안 읽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설도 껴 있어서 결국 열하루 걸렸네요. 평소 싫어하는 하드커버인데다가 책 두께도 다른 책의 거의 두 배여서 거부감도 들었지만 재미있는 책은 그 누가 분탕질을 쳐도 결국 읽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상권과 중권에 각각 감상을 썼기에 이번 글에는 하권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짤막히 쓰려 합니다.
하권만 따져보면 텐션은 여전합니다. '그것'보다 긴장감 유지에 더 큰 역할을 한 헨리 패거리 덕분이지요. 물론 중권에서 돌싸움으로 액션이 폭발하긴 했습니다. 전까지는 왕따클럽과 헨리 패거리가 같은 10대의 느낌을 풍기지만 이번엔 완전 역전되지요. 헨리가 아버지 부치 바워스를 따라(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2살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동안 같이 악동 짓을 하던 두 명의 친구도 이런 헨리의 모습에 어리둥절할 정도로요.
그리고 장면전환이 전보다 빨라져서 진행속도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이건 하권의 좀 뒷부분에서 그런데요, 인물마다 시야가 빨리 바뀌고 현재와 과거 각 시간대의 전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걸리는 속도(전 이걸 문장의 분위기나 단어의 갯수로 그냥 어렴풋이 느꼈습니다)도 전보다는 긴박하고 빨라졌지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처음 본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도약하는 순간을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현재) 벤은 자크 덴브로의 작업대를 비추던 깨끗한 노란 불빛고 기억한다. 그리고 빌이 했던 말도.
"우리 모두 조, 조,
(과거) 조심해야 해. 흔적을 나, 남겨 놓으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아빠가……." 빌은 '기, 길'을 되풀이하다가 가까스로 "길길이 화를 내실 거야."라고 말했다.
중반까지는 어떤 것을 보고 뭔가를 떠올린 후 과거로 넘어가는데요, 종반에 이르러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아주 절묘하게 왔다갔다 합니다. 이 방법참 쓸 만한 것 같아요.
묘사력은 역시 스티븐 킹, 할 정도입니다. 액션신 하면 치고 박고 날라차고 퍽퍽퍽 으악 윽 이러면서 괜히 페이지를 때우는 작품이 많죠. 하지만 진짜 액션신이라면 액션이 부르는 감정이나 통각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물론 조금 성향이 다르겠지만요. 하여튼, 인물이나 '그것'이 느끼는 충격까지도 생생하게 그린 킹 선생에게 박수 세 번 칩니다. 참 대단한 작가에요.
작가뿐 아니라 번역자에게도 박수를. 번역은 제 2의 창작이라더니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보다 모르는 어휘가 더 있답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더께, 옹송그리다, 대꾼하다, 희붐하다 등 번역서에서 보기 힘든 순 우리말글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로 쓰이지 않고 의미를 비틀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요. 이런 번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좀… 거시기해요. 총 5부의 장편인데 4부까지 비중 있게 그린 건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지요. 물론 이 소설에서 과거란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기억을 복원해내는 것이 과거에 그들이 부렸던 마법을 다시 부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있죠, 27년만에 데리에 모인 그들이 할 일은 결국 '그것'을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일은 5부에 가야지 제대로 시작해요. 양이 300쪽으로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게다가 어릴 때의 추격전이나 황무지에서의 돌싸움은 그렇게 잘 표현해놓고는 '그것'과의 결전은 글쎄요, 뭔가 뜬구름 잡는 듯했습니다. 전과 너무 달라진 액션(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에 조금 벙찌는 감도 있네요. 이상하게 스티븐 킹은 장편만 가면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특히 결말 부분에서.
사람의 상상력과 공포가 만들어낸 존재를 '그것(it)'이라고 표현한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것'은 빌에게는 동생 조지의 모습으로, 에디에게는 문둥이의 모습으로, 스탠리와 마이클에게는 새의 모습으로, 벤에게는 미라의 모습으로(비벌리와 리처드, 미안하다. 너희가 무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단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형상합니다. 데리라는 무대에서 왕따클럽 7명이 주인공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에든 존재하겠지요.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센 '그것'이었지만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약점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디가 평소 사용하는 천식약은 사실 수돗물에 쓴맛을 내는 게 섞인 의약일 뿐이지만 강력한 산성이라 믿고 '그것'에게 쏘자 '그것'은 진저리를 치며 도망가지요. 이 소재는 그렉 이건의 단편소설 <야경꾼>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편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여튼, 다 읽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묘사 때문에 상권에서는 지루한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중권부터는 마구 휘몰아치고 하권은 마지막 150쪽 정도가 조금 거시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장편이었습니다. 단숨에 읽을 정도의 흡입력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류의 소설은 재미를 추구하기에 인생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얻거나 삶을 뒤돌아보게 하지는 않지만요, 재미라는 본분에 충실하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당분간은 스티븐 킹의 장편은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별 거 아닌데 머리가 터질 듯한 느낌이 들까요, 왜.
(2012년 1월 24일 ~ 1월 27일, 602쪽)
반응형
'독서 이야기 > 독서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꼭 읽기 바랍니다 - 우리 글 바로 쓰기 1 (이오덕) (0) | 2012.02.02 |
|---|---|
| 글쓰기의 초석을 다지자 - 네 멋대로 써라 (데릭 젠슨) (0) | 2012.01.29 |
| 슬슬 드러나는 실체 - 그것 중 (스티븐 킹) (0) | 2012.01.25 |
| 잊고 있었던 악몽 - 그것 상 (스티븐 킹) (0) | 2012.01.21 |
| 살아간다는 것 - 인생 (위화) (2) | 2012.01.17 |




댓글